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사면(赦免), 그것은 여전히 은전(恩典)인가?(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25. 8.15)
여기를 클릭하면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460
사면(赦免), 그것은 여전히 은전(恩典)인가?
/원현린 주필(主筆)

원현린 주필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광복을 기리는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여권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특사를 놓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뿐이다. 아무리 실정법을 위반해도 힘 있는 세력 쪽이면 특사 받아 무난히 풀려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편향된 사면으로 국민 간 위화감만 조성했다는 여론이 높다. 이로 인해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울려 퍼져야 할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로 시작하는 광복 경축 노래 소리마저 사그라질 듯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 잣대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희생자라며.
민생(民生)이 어렵다. 당초 내세운 ‘민생사면’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는지 모른다. 필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을 단행 할 때마다 본란을 통해 사면에 관한 소회를 밝히곤 했다. ‘사면(赦免), 그것은 법(法)보다 높은 가치의 상징인가?’, ‘사면(赦免),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가?’라는 등의 제하에 소견 피력이 그것이다. 그때마다 사면의 명분은 ‘국민 대통합 실현’이었다.
우리의 사면 역사도 오래됐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의 사면 사례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린 것으로 보아 고대국가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왕의 즉위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등의 경우 단행하곤 했던 대사령(大赦令)이 있었다.
조선조에서도 국왕마다 거의 사면령을 내리곤 했다. 태종의 코끼리에 대한 이색 사면 기록이 실록에 있어 인용해 본다. 일본 국왕이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다(태종 11년). 전 공조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코끼리에 밟혀 죽다(태종 12년).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태종 13년). 순천부 장도에 방목 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에 방목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태종 14년).
오는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은 상기한 동물 코끼리에 대한 사면처럼 긍휼(矜恤)히 여겨 내린 사면도 아니다. 이번 특사의 경우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특정 정치인에 치우친 끼리끼리 단행한 사면이라는 혹평을 피하긴 어려울 게다. 국내 여론은 온통 ‘정치사면’에 대한 찬반으로 들끓고 있다.
사면에 대한 학설은 많다. 여러 학설 가운데 사면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설로 보는 학설이 다수설로 통하고 있다.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사면, 그것은 법보다도 더욱 깊은 원천에서 공급되어 법보다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 있는 것의 상징”이라는 이론이 있기는 하다.
오늘날 사면은 은사(恩赦)·은전(恩典)의 의미를 지니던 왕조시대의 사면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라 해도 남용되거나 악용될 경우 그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사면제도에 대한 존폐론(存廢論)이 나온다.
이제 “법은 귀하고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든가,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승불요곡(繩不撓曲) 따위의 법 격언들은 낡은 도서관에서나 찾아야 할 듯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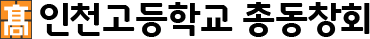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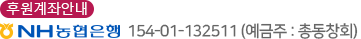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