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교만한 자는 고칠 수 없다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7. 3)
나채훈의 중국산책/
교만한 자는 고칠 수 없다
/삼국지리더십연구소장
의성(醫聖)이라 불린 편작(扁鵲)은 춘추시대 여러 나라를 돌며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펼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각국의 왕실과 고관대작들의 초대를 받아 그들과 관련된 여러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춘추시대의 첫 패자인 제환공(齊桓公)과 있었던 육불치(六不治)의 이야기는 요즘의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서 곰곰 되새겨봄직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환공은 처음 편작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의술을 펼치느라 가 본 여러 나라의 풍속과 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몹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편작은 제환공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 잠깐씩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병이 있음을 알았다. 기회를 보아 편작이 은근히 “제가 보기에 군주의 옥체에 병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제환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과인은 지금 매우 건강하다오. 병은 무슨 병이오?” 편작이 조심스럽게 다시 아뢰었다. “군주의 병은 지금 피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미약하지만 시일을 끌면 큰 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곧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환공은 속으로 ‘이 자가 병을 부풀려 재물을 챙기려는 흔한 의원들 수법을 쓰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어 “알았네. 과인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돌아가게나”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 한 달 여가 지났다. 궁에서 편작을 연회에 초대한다는 전갈이 왔다. 세자가 성년이 되어 대궐에서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다. 그날 제환공은 편작을 보자 짓궂게 물었다. “편공, 과인이 이렇게 건강하네. 아직도 그대는 과인에게 병이 있다고 할 텐가?”
편작은 공손히 대꾸했다. “물론 군주님의 병은 확실합니다. 지난 번 뵈올 때는 병이 피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혈맥 안으로 들어갔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환공은 이 말에 너털 웃으며 주위의 고관들을 불러 편작의 오진(誤診)을 보라는 듯이 킬킬거리기까지 했다.
그날 궁궐에 다녀온 편작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제나라에 있기 싫었지만 그래도 의술을 배운 사람으로 모른 체하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편작은 혹시 하는 생각으로 한 달 여를 더 기다렸다. 세 번째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세자빈을 간택하는데 여인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소임을 마친 편작은 제환공을 보고 다시 아뢰었다.
“군주님의 병환은 이제 혈맥에서 장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자 제환공은 짜증을 냈다. “이보게 편공, 과인은 멀쩡하다네. 계속 그딴 소리는 말고 지난 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나 들려주게나.”
편작은 속이 상해서 볼 일이 남아 있다고 핑계를 대고는 궁을 물러 나왔다. 어차피 다른 고관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자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명정승 반열에 올랐던 관중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제환공 주변에는 하찮은 인물들이 득시글거리고 있었기에 달리 해결 방도가 없을 수밖에. 편작은 제나라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며 나날을 보내면서도 다시 한 번 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다. 그 기회가 왔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사신의 환영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날 잔치에 다녀온 편작은 서둘러 제자를 불러 모으더니 “시간이 없다. 여기를 떠나야겠다”면서 모두 짐을 싸도록 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다. “스승께서는 군주의 병이 염려되어 떠날 수 없으시다더니 오늘은 왜 이리 서두르십니까?” 편작이 대답했다. “이미 군주의 병은 골수에 들어갔다. 설령 대라신선이 온다 해도 고칠 수 없다. 자칫 우리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 도망쳐야지.”
편작이 달아나고 나흘 후 제환공의 죽음이 전해졌다고 한다. 이때 편작이 육불치(六不治)에 대해 제자들에게 강론한 것이 지금도 전해온다. 첫째, 교만한 자는 이치를 불문하고 고칠 수 없다. 둘째,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고칠 수 없다. 셋째, 의식(衣食)이 적당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등등이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적고 ‘신의에게 일찍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것을(能使良醫得蚤從事 則疾可已 身可活也)’ 하고 안타까워했다. 요즘 정치도 몹시 닮은 것 같아 안타깝다.
2012년 07월 03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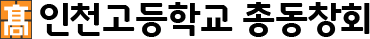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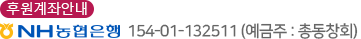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