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추억의 소품이 된 운동기구(퍼온글)
본문
퍼온곳 : 굿모닝 인천(2012/03월호)
추억의 소품이 된 운동기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글. 조우성_시인,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그 옛날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란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무사들이 고구려 쌍영총 벽화 속의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거나, 남정네들이 김홍도의 풍속도 한가운데서 힘을 겨루며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은 아무래도 ‘무예’나 ‘놀이’의 차원이었다고 보인다.
조선 말 때까지도 ‘스포츠 개념’은 없었던 듯 싶다. 그 시절 양반들은 매사 힘든 일을 하인에게 대신시켰는데, 스포츠도 ‘힘든 일’의 하나로 치부해 “왜 땀 흘려가며 힘든 일을 굳이 하는가?”며 혀를 찼다는 풍물시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가 ‘운동’이란 이름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의 일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당들은 ‘운동’의 선구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먼저 택한 ‘운동’이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조나 달리기 등이었을 것은 쉬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인천 영화학당에서도 교사 ‘제시 비 마아커’가 체조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영화70년사’에 남아 있다.
체육은 1885년 2월 공포된 ‘교육조서’에 이미 3대 강령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1895년 공포한 ‘소학교령’에는 체육의 목표를 아동건강의 유지 증진과 발육 발달로 보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체조’를 시행토록 했던 것이다. 이 때 외국어학교에서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 매일 1교시에 30분씩 체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현 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관립일어학교 인천지교가 1895년에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그 무렵 인천 지역에 ‘체조’가 널리 보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인 1906년부터는 보통학교에서도 매주 3시간씩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행하였다. 하지만 그를 가르쳤던 외국인이나 군인 출신의 교사가 부족하였고, 시설과 장비도 열악하였다.
그런 결과로 체육 시간은 주로 병식(兵式) 체조 위주로 진행되었다. 1907년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목총(木銃)을 둘러메고 북을 치며 시가행진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인천 영화학당 학생들의 고적대 활동은 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라고 하겠다.

역기 100년 전 제품이다
그러나 체조가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다. 1925년 JOAK 동경방송국에서 시작한 것을 JODK 경성방송국(지금의 KBS 전신)이 그대로 답습한 ‘라디오 체조’가 그것이다. 명분은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이었지만, 속내는 ‘제국주의 이념의 강화’였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도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는 군국(軍國)의 향수에 젖어 아침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구령에 맞춰 시행하는 ‘라디오 체조’에 참여하고 있고, 광복 후 전국 각지의 직장, 사회단체, 학교에서 행했던 ‘국민 체조’와 군대에서 배웠던 ‘국군 도수 체조’가 그 뿌리를 다 일본의 ‘라디오 체조’에 두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어쨌거나, 체조의 기본은 손으로만 하는 ‘맨손체조’였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몸놀림을 통해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 함양 등을 꽤했던 것인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점차 기계 체조와 리듬 체조 등으로 발전해 갔다.
체조에 자연스럽게 기구나 도구가 융합돼 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큰돈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철봉’이었다. 지름 28mm의 철제 봉에 매달려 탄력을 만들어 위로 오르거나, 회전력을 이용한 철봉 동기 등이 혼합된 기계체조의 하나다.
떡갈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 2개를 나란히 잇대 놓은 ‘평행봉’ 위에서 하는 ‘평행봉 체조’도 있다. 독일에서 고안된 이 체조는 매달리기, 오르기, 팔지지(支持), 팔 짚고 몸통 바로잡기 등 기본자세로부터 흔들기, 돌기, 수평서기, 물구나무서기, 내리기 등 갖가지 화려한 기교를 구사한다.
‘링’ 체조는 공중에 매단 줄 아래 끝에 둥근 쇠고리를 달아 그에 매달리거나 발을 끼워서 하는데, 그 모습이 날렵하고 아름답다. 처음에는 멈춰서 하는 운동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흔들기와 진동기(振動技) 등 힘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체조 종목으로 떠올랐다. 한때 크게 유행해 방앗간의 피대를 적당히 잘라 만든 ‘손목 보호대’를 보란 듯이 뒷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추억의 소품이 된 운동기구나 도구들도 있다. ‘훌라후프’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자 그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 훌라후프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온 가족이 엉덩이를 흔들어가며 운동에 열중했던 것은 1970년대만의 풍경이었다.
그와 함께 국가 최대의 체육행사였던 전국체전의 개막식 마스게임에 단골 프로그램으로 등장했던 곤봉체조도 기억에 아련하다. 흰 운동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절도있게 펼쳤던 멋진 곤봉체조에 응원 나온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은 가슴을 설레기도 했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사랑받는 운동기구는 저절로 앉아만 있어도 운동이 된다는 무슨무슨 머신 같은 허황되고 값비싼 최신식 운동 보조기구가 아니다. 베스트셀러는 손에 익어 애착이 가는 원형적 운동기구들이다. 기능이 단순, 간편하고, 값도 저렴해 늘 곁에 두고 이용할 수 있는 줄넘기, 아령, 악력기(握力機), 역기 등이 아닐까 싶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운동기구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관장 최웅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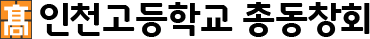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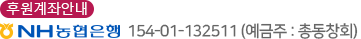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