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지용택(56회) 칼럼/버려야 통한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2. 1. 3)
버려야 통한다
/지용택칼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루는 지루한데 1년은 왜 이렇게 빠르지"라고 말한 시인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한번쯤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벌써 2011년이 저물고 2012년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안철수교수가 불러일으킨 한방의 펀치가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받았으나 요지부동이던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끼친 신선한 파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민주화를 이어온 양대 정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안철수교수의 주먹이 센 탓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정치와 정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고 내공이 없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말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소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소통은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통은 대통령,재벌총수 등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슬기와 자기자신이 지금껏 고집스럽게 지켜온 주장마저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권자 그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설명을 듣고 상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직업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해있는 현장과 상황 그 자체가 소통의 상징입니다. 나라의 모든 방면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사회는 영원히 소통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런 사회는 어두워지고 분열되고 차갑게 식어 버리는 것입니다.
해학과 촌철살인의 묘를 살려 사람들에게 웃음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편에 보면 백성의 소리를 "귀로 듣지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마음으로 듣지말고 전체(氣)로 들어라. 귀로 듣는 소리는 귀에서 멈추고 마음으로 듣는 소리는 서로의 약속에서 멈춘다. 그러나 전체(氣)로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야만 상대의 의사를 그대로 소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無聽之以耳,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而聽之以氣. 聽止於耳,心止於符. 氣也者,虛而待物者也)." 내마음이 욕심, 고집, 우월감으로 가득차 있는데 서민의 말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또하나 <논어(論語)>는 2천6백년 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고전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 책이 인류보편의 가치를 중시해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과 입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옳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방법을 추구했지만 한번도 자기주장을 무상의 진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자가 자기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근엄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은 공자가 제자들과 길이 엇갈려 서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잠시후 누군가가 공자를 찾는 제자들에게 동문에서 공자처럼 생긴 사람을 보았다며 그 모습을 묘사했는데, 행색이 영락없이 '상갓집 개(喪家之狗)' 같더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공자의 곤궁하고 초라한 행색을 빗댄 말을 듣고 속이 상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슴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자는 "다른 건 몰라도 상갓집 개 같다는 말은 내가 들어도 그럴 듯하구나"라고 껄껄 웃으며 거침없이 긍정했습니다. 이것은 스승으로서 자신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위로이자 정곡을 찌른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공자는 이처럼 언제나 현실과 일상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는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나으며 장례는 그 형식을 다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라(禮與其奢也寧儉 喪與其易也寧戚, <논어> '팔일' 4편)"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이 얼마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꾸밈없는 마음의 예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실을 직시하면서 진실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2012년 01월 03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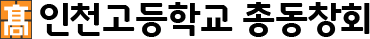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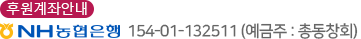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