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여름나기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7.28)
원현린 칼럼 /
여름나기
그제부터 내리는 폭우가 그치면 또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다. 폭염이 시작되었던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총 154건의 온열질환이 발생, 이 중 5명이 숨졌다고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가 높다. 지수가 70 정도면 비교적 쾌적하다고 느낀다. 75 이상이면 절반 정도가, 80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요즘처럼 지루하게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나 복더위에는 불쾌지수가 80 이상이 된다.
무더운 여름을 ‘복(伏)더위’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에는 초복·중복·말복 등 삼복이 있다. 여기서 엎드릴 ‘伏’자는 人+犬 두 글자가 합성된 회의문자(會意文字)로 너무 더워 개처럼 엎드려 쉬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 왔다.
근세까지만 해도 ‘복’자가 뜻하는 것처럼 무더운 날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사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었다.
더위가 지속되면 건강을 상하기 쉽다. 더위를 피하지 말고 맞서 이겨내야 하겠다. 그래서 예부터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보양식이 있어 왔다.
마을 단위로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천렵(川獵)을 하곤 하던 것이 그 한 예다. 요즘은 물고기를 함부로 잡을 수도 없지만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쑤어먹는 놀이는 예전에 농촌에서 주로 남자들이 여름에 하는 피서방식이기도 했다. 먹을거리가 변변치 못했던 때에 달리 뾰족이 영양을 섭취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게다.
인천과 같은 해안지방에서는 살림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은 민어를 푹 고아먹었다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에도 보양식으로 통하는 개고기를 주로 먹었다.
다음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실려 있는 복날 풍습에 관한 이야기다.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狗醬)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판다”
조선 시대의 세시 풍속에 관한 또 다른 책으로 한양에서 행해지는 궁중 및 관아, 민간의 풍속을 월별로 기록한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도 복날에는 “개를 잡아 삶아 국을 끓여 양기를 돕고 팥죽으로써 여역(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예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래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더우면 추운 겨울을 생각하게 되고, 추우면 더운 여름을 생각하게 된다. 겨울추위 동장군(冬將軍)이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무더위를 의미하는 불의 왕, ‘염제(炎帝)’보다는 아래인 ‘장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 중국의 삼황 중 두 번째인 신농(神農)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염제다. 신농은 여름을 맡은 신으로 태양신이자 농업 신이기도 하다. 불을 맡아 다스리는 신, 화덕(火德)의 왕이었으므로 불꽃 염(炎)자에 임금 제(帝)자를 써 ‘炎帝’라 했다.-
여전히 날씨가 무더운 삼복더위다. 속설에 의하면 복날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복날에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 한다.
또 복날에는 논의 벼가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고 한다. 벼는 줄기마다 마디가 셋 있는데 복날마다 하나씩 생기며 이것이 벼의 나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벼는 이렇게 마디가 셋이 되어야 비로소 이삭이 팬다고 한다.
벼 이삭이 패는 시기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다. 말복이 지나면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계절이 온다.
이제 보름 만 있으면 벼의 셋째 마디가 생긴다는 말복이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기다리며 올 복더위도 건강하게 넘겨야 하겠다.
2011년 07월 28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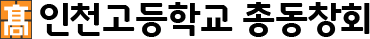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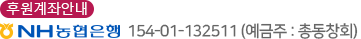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