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혁명과 쿠데타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5.19)
원현린 칼럼 /
혁명과 쿠데타
권력의 교체방식에는 평화적(합법적) 수단에 의한 교체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비합법적) 수단에 의한 교체가 있다. 비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에는 두 가지, 혁명과 쿠데타가 그것이다. 한 정변(政變)이 일어나면 그것이 혁명이냐, 아니면 쿠데타냐 라는 논란이 일기 마련이다. 1961년 5월16일에 일어난 5·16군사정변을 두고, 그 사건이 혁명이다, 쿠데타다 하며 여전히 논쟁이 가시지 않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쿠데타라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양에서의 혁명은 ‘천명(天命)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周易)에 “은나라의 탕왕(湯王)과 주나라의 무왕(武王)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혁명을 일으켰다. 그럼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성은 극히 큰 의미를 가진다할 것이다. - “탕무혁명(湯武革命), 순호천이응호인(順乎天而應乎人), 혁지시(革之時), 대의재(大矣哉)”- 라 했다.
혁명(革命)이란 단어 중 ‘혁(革)’은 짐승의 가죽으로 갓 벗겨 낸 날가죽인 ‘피(皮)’를 무두질하여 새롭게 만든 가죽을 뜻한다. 가죽을 손질하면 새롭게 변한다. 혁명의 ‘혁’자에는 이렇게 짐승가죽의 털을 제거하고 손질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역에는 또 ‘택중유화혁(澤中有火革) 군자이(君子以) 치역명시(治曆明時)’라 했다. - 못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이 혁괘(革卦)의 괘상이다. 군자는 그것으로 역수(曆數)를 다스리고 때를 밝힌다.- 물과 불이 서로 상극(相剋)이 되어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연유로 혁(革)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 연못바닥에 불덩이가 앉아있는 형상이다. 무엇인가 뒤집어 놓아야 할 괘가 곧 ‘혁’이다. 일찍이 맹자는 폭정을 간하여 듣지 않으면 역위(易位) 즉 군왕을 갈아치우는 역군지위(易君之位), 역성혁명(易姓革命)도 가능하다 했다.
혁명의 영어 Revolution은 ‘등을 돌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Revolvitaie’에서 유래됐다. 혁명이란 피지배 계급이 기존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법적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교체의 양식이다.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또 다른 하나, 혁명 외에 쿠데타가 있다. ‘쿠데타(coup d'Etat)’는 프랑스어로 ‘국가에 대하여 일격을 가한다.’라는 뜻이다. 개인 또는 집단이 보통은 제한된 폭력을 행사하여 정부당국의 지위를 기습적으로 탈취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혁명이 피지배계급에 의한 반란인데 비해 쿠데타는 일부 지배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혁명은 피지배계급인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반항인데 대하여 쿠데타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적 세력 사이의 권력탈취 투쟁이라는 점이다.
‘누구를 위해 거사했느냐’가 판단의 잣대라 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혁명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쿠데타라고 풀이하고 있는 사전도 있다.
역사적 한 사건을 놓고 정치세력 간 해석이 분분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 혁명이니 쿠데타니 하며 역사를 운운해 봤다.
역사의 해석이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역사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무수히 많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했고,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이라 했다. 영국의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도 ‘5·16’이라는 하나의 정변을 두고 여전히 혹자는 혁명이라 하고 혹자는 쿠데타라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수도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역사는 해석자가 처한 상황과 입지여건에 따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해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2011년 05월 19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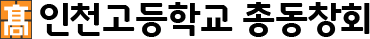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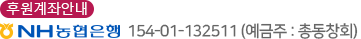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