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나채훈(65회)의 중국산책/집합기억 속의 고통, 되살려보면(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 5.27)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집합기억 속의 고통, 되살려보면
/나채훈(중국역사문화연구소장)
위진(魏晉) 시대라고 하면 조조와 유비·손권이 천하를 겨뤘던 삼국시대의 직후다. 이 시기의 귀족들에 관한 일화 모음집 「세화신어(世話新語)」 <태치편(汰侈篇)>에 보면 황당하리만치 사치 경쟁을 벌였던 모습이 나온다. ― 왕개가 쌀을 쪄서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 밥을 짓자, 석숭은 양초를 연료로 밥을 짓는다. 다시 왕개가 푸른 능견으로 안감을 댄 비단 장막을 약 40리(16㎞)에 걸쳐 만들자 석숭은 보라색 비단천으로 약 50리(20㎞)의 장막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왕개는 태후의 친정동생이고, 석숭은 진의 창업공신 석포의 아들, 그런데 여기에 황제의 사위인 왕제까지 가담하여 사치 경쟁은 도를 넘는다. ― 왕제는 장인인 황제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음식을 차려 내놓은 그릇이 모두 청보석 제품이었고 1백 명이 넘는 시녀들은 호사스런 비단 바지와 윗옷을 걸치고 대접했다. 이때 삶은 돼지고기가 맛이 연한데다 빛깔이 진하여 이를 신기하게 여긴 황제가 이유를 묻자 ‘임산부들의 젓으로 키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들 귀족들의 사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석숭은 형주자사로 있을 때 원정오는 상인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고, 왕개는 태후의 권세를 이용하여 뇌물과 벼슬을 판 것으로 유명했고, 왕제는 아예 마누라인 공주를 앞세워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해서 억만금을 모았다고 한다.
그들의 ‘금(金)이 열리는 나무’는 쉴새없이 금덩이라는 과실을 생산했다고 기록은 비웃는다. 더하여 ‘그들의 선조들은 후한 말 어지러운 난세에 저항파 지식인으로 명성을 쌓았는데 후손들은 선비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망치는 볼썽사나운 짓을 했다. 누구나 권세와 금력이 강해지만 이런 것일까?’ 하고 탄식하고 있다. 사치 향락의 기념비에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7천200만 원짜리 타일 욕조, 1억 원짜리 침대…’ 웬만한 빌라 한 채 값의 초호화 고가 제품들이 서울 강남에서 인기라고 한다. 하이힐 모양의 금·은 도금 욕조 오드리에 소위 부자들 반응이 상당하고, 스웨덴 침구 브랜드 <해스텐스>의 침대는 1억3천8백만 원짜리. 화장품도 <라메르>의 디 에센스(45㎖)가 285만원, <스위스퍼펙션>의 시크릿 마스크(15회용)는 250만원, <가네보>의 그랜뮤라 크림(40g)은 170만원. 이런 경향이 남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는 소비 강박 관념과 허영심 탓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구입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외국에서 팔리는 값의 2배를 불러도 한국에서는 잘 팔린다고 하니 최고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경쟁적 심리를 뒷받침하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지….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등소평 중국 국가주석이 개방정책을 내건 1978년 이후를 신자유자들은 평화와 번영의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계화(世界化)라는 용어 속에 그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세계의 GDP 성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구 1인당 성장도 30여년 전보다 거의 10배 가량 늘어났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수치상으로 지구촌의 인류는 훨씬 더 행복해져야 하고 삶의 질도 풍요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 전략으로 세상 사람들의 복지가 향상되었을까? “성장과 물질적 복지의 증진은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아직도 빈 말잔치에 불과하고 오히려 빈곤 모델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 속에서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일동포 사업가 손정의는 “국가가 어려울 때 경제인이기 이전에 생명을 생각하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트위터를 통해 토로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신(物神)을 숭배하는 대신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존중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평화와 번영이란 자칫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요란한 사치 소동, 정치권의 온갖 복지 약속을 바라보면서 역사라는 집합기억에 담겨 있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 숱한 무명인’의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고 싶다.
2011년 05월 27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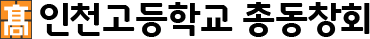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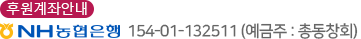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