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생활의 발견 '다리풍'/조우성(65회)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본문
퍼온곳 : 굿모닝인천(2011/2)
생활의 발견 '다리풍'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글 조우성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종훈 자유사진가

그 옛날, 관에서 소식을 전하자면 파발꾼을 보냈다. 인천에서 서울을 가자해도 단 시간에 가 닿을 수 없는 고단한 일이었다. 인천감리서(지금의 인천시청)에서 조정에 보고하는 일조차 그랬으니, 민간에서 사사롭게 기별하는 일은 더 만만치 않았다. 그와 같은 역참제를 폐지하고 백성들도 자유롭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84년 11월 17일이었다. 서울과 인천에 우정총국과 분국을 동시에 설치하고, 근대 우편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우정국이 폐쇄되었고, 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은 대역죄로 처형되는 불운을 맞았다. 이 사건은 전신 매체의 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주문해 놓은 전신기 구입이 그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인 1885년 7월, 청나라가 인천~서울~평양~의주에 이르는 ‘서로전선(西路電線)’을 가설하자, 조선정부는 서둘러 한성전보국을 설치하고,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업무를 경인간에서 개시했다.
이 무렵 한글의 모르스 부호화가 이루어졌고, 1888년에 비로소 ‘전보장정(電報章程·인천개항박물관 소장)’이 제정, 반포되었다. 그러나 전신이 식민 침탈의 도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백성들은 “전보를 통해 전염병이 나돈다.”며 시설들을 파괴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전화는 호의적이었다. 기록상 전화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82년 3월이었는데 청국 유학생 상운(尙澐)이 귀국하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갖고 들어온 2대가 그것이었다. 당시 전화기는 ‘다리풍’이라 불렀는데, 이는 영어 ‘텔레폰’에서 음만을 취한 중국식 가차명(假借名)이었다. 나중에는 ‘말을 전하는 통’이라는 뜻으로 어화통(語話筒) 혹은 전어기(傳語機)라고도 불렀다.
‘다리풍’이 정식 도입된 것은 그 한참 뒤인 1894년 1월이었다. 궁내부(宮內府)에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에서 기기와 운용 시설을 들여왔다. 그해 3월 1일, 한성전보총국이 전화기 시험과 그를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어 참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지만, 전화 가설은 어수선한 정세로 실현되지 않았다. 전화가 개통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였다. “대궐 안에서 각 부로 전화기를 연결하였는데, 아이들이 종이연을 날리다가 자꾸 연줄이 전화기 줄에 얽혀 전화가 잘못되는 고로 경무청에서 각 교번소에 신칙하여 아이들의 연날리기를 엄금한다 하더라.” 독립신문 1898년 1월 8일자 보도 이전에는 전화에 관한 일체의 보도나 관보의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울~인천 간의 전화는 1898년 초에 개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전하는 ‘백범 선생의 전화 구명설(求命說)’은 착오로 보인다. 창원대 사학과 도진순 교수에 의하면, ‘병신년 8월 26일’은 ‘1896년 10월 2일’(양력)로 그날 법부가 인천감리서에 전보를 보내 백범의 사형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경인간에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 2년 뒤인 1898년이었고, 민간에서는 1902년 3월부터 통화를 시작했다. 이로써 인천은 관용, 공중용 전화를 최초로 가설한 통신사업의 시발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후 전신은 이메일 보급 등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반면 전화는 눈부신 변천을 거듭해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 서비스를 인천에서 시작해 시발지로서의 전통을 화려하게 계승했다. 그러나 그 사용법은 옛날만 못한 듯싶어 안타깝다. “상투를 단정히 고쳐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아 머리 위에 쳐드는 읍(揖)을 하고서 전화를 돌렸다. 상대방이 나오면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다 말하고, 상대 부서의 장과 부모의 안부까지 묻고서 안건을 말했다.(이규태 코너)”는 초창기 ‘전화 도덕’에 비하면, 문자 공세, 초상권 침해, 금융사기 등으로 오늘의 몰골은 부끄럽다. 그 옛날처럼 통화 중 상소리를 하거나 거친 말다툼이라도 벌이면 교환수가 나서서 통화를 정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전화도덕 회복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듯싶다.
참고 자료 : 한국의 전기 통신(한국통신),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광역시), 간추린 인천사(오종원 외), 전화의 역사(강준만), 이것이 한국 최초(김은신), 주해 백범일지(도진순), 인천이야기100장면(조우성), 독립신문, 조선일보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옛 전화기의 실제 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3천원, 학생 2천원. 문의 764-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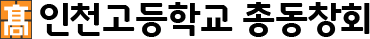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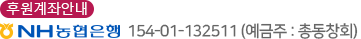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