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음서제(蔭敍制)의 부활인가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0. 9.16)
원현린 칼럼 /
음서제(蔭敍制)의 부활인가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원장 초청으로 삼청동 감사원에서 오찬을 한 적이 있었다. 기념품으로 마패(馬牌)가 새겨진 넥타이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감사원은 그 옛날의 암행어사 신분을 나타내던 마패를 원의 상징으로 삼았다 했다.
어린 시절 ‘춘향전’과 ‘어사 박문수’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마패를 내보이며 권선징악(勸善懲惡)하는 장면을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서 통쾌해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마패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감사원의 상징으로 눈과 귀를 나타내는 로고와 더불어 마패를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삼국시대로부터 사정부(司正府), 어사대(御史臺), 사헌부(司憲府) 전통을 이어 받았기에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오한 관리들을 징치(懲治)한 암행어사의 신분 증표였던 마패를 주요 상징물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조의 암행어사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게다.
지난날 관리채용방식의 하나였던 음서제(蔭敍制)의 부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금은 사라진 이 음서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과 처족을 과거(科擧)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니라, 출신만을 고려하여 관리로 서용하던 제도이다.
감사원의 수장을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 딸과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음서제인 특채는 중앙부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유력 인사 자녀들이 공직에 특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잘못은 한번 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데 있다. 이번 고위 공직자 자녀 특채 시비(是非)는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더 이상 고위공직자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있지도 않은 음서제도에 의해 특별 채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더 이상은 밤새워 공부한 많은 보통시민 수험생들이 들러리만을 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제와 어제사이에 진정한 특채의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중증 장애인을 5급 공무원에 특별 채용한 것이다. 컴퓨터 분야 박사인 그는 불편한 몸으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사무관의 신분을 취득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특채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오해 받는 것만으로도 공직자는 유죄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언젠가 본란을 통해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유죄라 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는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최대의 명예손상이다. 한 사람의 명예실추는 법관 전체의 명예 실추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법관들에게 몸가짐을 가르쳤다. 그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 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여야 한다.”라고 법관들을 향해 당부했다. 그렇다. 법관 뿐 아니라 전 공직자가 그래야 한다.
취지가 좋았던 암행어사제도의 실패 이유로 어사들의 부정부패를 들고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감사기관을 감사할 자 그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검사들이 특검에 의해 조사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검사가 검사에 의해 기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외교부, 감사원, 검찰이 그렇고, 국회도 그렇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고 바랄 곳이 없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 했을 때 믿고 바랄 것은 헌 셔츠 하나 걸친 자기 자신 뿐”이라고 말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했다. 대통령의 사정기관 재점검의 지시는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목소린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잘못하여 평생을 몸바쳐온 자리를 불명예로 마감하는 고위관료들을 보고 있노라니 연민의 정까지 느낀다. 음서제가 부활하고 상층부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공정사회를 이룰 수 없다.
2010년 09월 16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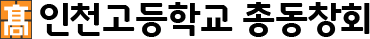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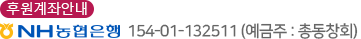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