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지용택(56회)/영흥도 제4수용소의 기억(퍼온글)
본문
퍼온곳 : Good Morning INCHEON (2010. 6)
내가 겪은 인천의 6·25전쟁
함포사격으로 파괴된 박물관 유물들
우리는 올해로 6·25전쟁 6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그간 이 땅 인천에서 벌어진 전쟁의 실상과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대들이 어떻게 살아 갔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증언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역사의 공백을 채워가는 일환으로써 이번 호에는 원로 몇 분이 증언한 생생한 6·25전쟁의 체험담을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정리 조우성 시인ㆍ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영흥도 제4수용소의 기억
/지용택(당시 창영초등학교 학생)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돌자 어머니는 온 집안 남자들을 남쪽으로 피난 보낼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셨다. 어린 나는 매형을 따라 나섰는데, 당시 땔나무 장터인 지금의 제일제당 바로 옆에서 목선을 타고 충청도 서산군 팔봉면 흑석리라는 곳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다.
흑석리는 조용하고 이름다운 어촌이었다. 한 달, 두 달 보내는 동안 동네에는 끔찍한 소문이 나돌았다. 연일 계속되는 폭격으로 인천에는 온전한 집 한 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즐비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인천에 남으신 어머니가 그립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사돈어른께 집에 보내 달라고 매일 밤낮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또 가져온 쌀이 떨어지자 금반지, 옥비녀를 보리쌀과 바꿔 식량을 했고, 그나마 지니고 온 패물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너 나할 것 없이 ‘죽을 때 죽더라고 집에 가서 죽자’는 생각뿐이어서 마침내 돈을 추렴하여 인천 갈 목선을 빌렸다. 낮에는 유엔군 비행기가 공격할 수도 있으므로 밤이 돼서야 출발했다.
그 날 따라 유난히 바람도 없어 돛단배는 흐느적 흐느적 느리게 나갔다. 날이 샐녘쯤 해서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영흥 쪽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 우리 선장은 돛을 내리고 배를 천천히 영흥에 대었다. 뭍에 오르니 그곳엔 이미 우리 해병대와 미군이 상륙해 있었다. 간단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는 제4수용소란 곳에 억류돼 있었다.
군에서 주는 쌀 한 홉, 보리 한 홉으로 하루를 견디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니 산처럼 거대한 전함이 인천 앞바다에 가득 몰려오면서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굉음을 내며 함포사격을 시작했다. 하늘엔 당시 ‘구라만’이라고 부르던 프로펠러 전투기들이 새까맣게 떴다.
내 부모형제가 있는 인천은 불바다가 되는데 어린 가슴 속에는 절망과 경이로운 광경이 교차돼 정신이 없었다. 전함들 주변으로 가끔 하얀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곤 했는데 이는 인천에서 반격하는 인민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군인들은 상기된 얼굴로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들은 지난 3일간의 폭격과 포격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하면서도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니 기쁘기도 하였다.
그 다음날 새벽, 총성과 군화소리가 요란해 잠에서 깼다. 시간이 지나 동 틀 무렵이 되어 하얀 광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나는 겁없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새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하고 마주 보이는 제1수용소에서 인민군 몇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제2, 제3수용소를 거쳐 우리 쪽으로 오는 인민군을 보는 순간, 평소 친절했던 해병 대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살려 달라”며 우리 수용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어느 새 평복을 입고 있었다.
잠시 후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여기 이승만 군대가 없느냐”고 물었다. 우리 중 제일 연장자였던 사돈어른께서 보다시피 인천으로 돌아가는 피난민뿐이라고 말했다. 인민군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인지 우리들에게 “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라고 했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바로 다음날 유엔군 함정을 바라보면서 해병 대위와 함께 ‘인민군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군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피해를 준 일은 없었다. 하루가 지나자 언제 빠져나갔는지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당시 어린 소견에도 왜 영흥도를 습격해서 하루 만에 후퇴했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인민군이 후퇴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섬으로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누가 말했는지 언덕 위의 집은 위험하다 하여 피난민들은 모두 논밭으로 숨어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이틀 후 해병대가 섬에 상륙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미군 장교와 해병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고 한다. 그 다음 다음날, 우리는 수용소 생활을 청산하고 해군 702 함정을 올라 유엔군과 해병대의 뒤를 이어 인천으로 향했다. 상륙작전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 배 안의 피난민들은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서기 시작했다.
나는 함정에서 어머니가 온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했다. 멀리 바라본 월미도는 이미 옛 월미도가 아니었다. 해군 기지에 내려 보니 민둥산이 된 월미산에는 인민군이 설치한 참호와 토치카, 그리고 여기저기 포탄이 파헤쳐 놓은 흙구덩이와 쓰러진 나무밖에 없었다. 월미 다리를 건너 만국공원에 이르니 그곳도 포탄 구덩이와 인천 앞바다를 겨냥한 대포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미술시간에 즐겨 그리던 인천각(仁川閣)도 포탄에 맞아 무너진 성곽처럼 허물어져 옛 자태를 잃어 버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도 영흥도 피난시절 그곳에 주둔했던 해병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의 무용담을 듣고 나서 “후퇴해야 할 인민군이 영흥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하고 물었다. 그 해병은 그것도 몰랐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당시 북한 부수상이었던 이승엽의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특명을 받은 특공대의 공작이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그렇지, 이승엽의 고향이 섬이라더니 영흥이었구나.’ 싶었다.
그는 인천창영초등학교로 유학와서 인천고의 전신인 인천상업학교 재학 당시 3·1운동에 가담해 퇴학당하였고, 그 후 조선공산당을 만든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고향 영흥에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을 영화처럼 보았던 나는 당시의 여러 일들을 다시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던 화두 하나를 풀어 버리니 월미도와 영흥도가 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새얼문화재단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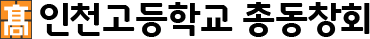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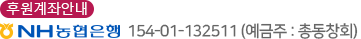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