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오광철(53회)의 전망차/한 어깨에 두 지게(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0. 2. 1)
오광철의 전망차 /
한 어깨에 두 지게
지게에 대한 속담이 많은것을 보면 우리 옛 생활에서 지게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던것 같다. 예를 들면 사람이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의 ‘한 어깨에 두 지게 질까’가 있고 하는 짓이 어울리지 않고 서투름을 일컫는 ‘양반 지게진것 같다’라는 것이 있다. ‘지게지고 제사 지내도 제 멋이다’는 남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말라는 뜻이다.
지게는 사람이 물건을 등에 지고 나를 수 있도록 만든 고유의 운반 기구다. 곧은 소나무에 뿔처럼 가지가 돋힌 두개를 어깨 너비로 세우고 나무를 가로질러 고정하고는 어깨에 질 수 있게 멜방을 달았다. 지게는 단단한 나무로 만드느라 비교적 가벼우면서 튼튼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돋힌 가지여서 거기에 무거운 짐을 싣더라도 견딜 수 있었다.
예전 농사를 짓고 산에서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다 살아온 우리네 살림이라 지게는 요긴한 도구였다. 이것을 지고 나무꾼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놈팔자 무슨일로/지게목달 못면하고/어떤사람 팔자좋아/고대광실 높은집에/사모에 병반달고/만석녹을 누리건만/이런팔자 어이하여/항상지게 못면하고/죽자하니 청춘이요/사자하니 고생이라’
지게는 지방에 따라 종류도 만들어진 모양새도 달랐다. 전북 서해안지방에서는 지게뿔을 참나무로 깎아 꽂았으며 짐을 많이 실으려 지게뿔 쪽으로 긴 막대기를 덧끼웠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지게가 있고 부스러기 짐을 싣느라 싸리로 엮어 만든 바소거리를 뿔 위에 얹었다. 지게는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의 생업수단이기도 했다. 어렵던 시절 역전이나 시장주변에 지겟군이 있었다. 지겟군교장 이야기도 있다.
지게에는 이런 사연도 있었다. 고려장 때 지게로 노인을 내어다 버렸다. 노모를 지게에 져다 버리고 오는데 따라나섰던 어린 것이 버린 지게를 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까짓것 왜 가져오냐니까 다음에 아버지도 늙어 버릴 때 쓰려고 그런다고 해서 뉘우쳤다는 옛이야기이다.
금강산에 지게로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와 화제가 됐던 효자가 이번엔 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한다. 한 어깨에 두 지게 지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10-01-31 18:1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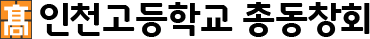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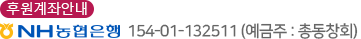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