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오광철(53회)의 전망차/“마음엔 멍입니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09. 9. 3)
오광철의 전망차 /
“마음엔 멍입니다”
문신이란 살갗을 바늘로 찌르고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入墨(입묵) 刺文(자문)이라고도 한다. 문신의 풍습은 아주 오래 전이다. BC 2000년경의 이집트 미이라나 임금의 무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늦어 문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의 경우는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韓(한)의 남자들은 때로 문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문신의 풍습은 삼국시대에도 널리 퍼졌을 것이다. 고려 때에는 도둑에게 형벌로 문신을 했다. 도둑의 팔에 문신표시를 하면 옷소매로 가려지므로 얼굴에 문신을 박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이 간다. 조선조 세종실록에는 도둑의 뺨에 문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달아났다가 잡힌 노비의 뺨에도 문신을 했다. 즉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뺨에 ‘逃婢(도비)’라고 박았다고 한다.
문신은 옛날 미개사회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의 도서지역에 성행했다. 심한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피부에 상처문신을 했다. 문신이 어째서 행해졌는지는 여러 설이 있다. 액땜을 위한 주술적인 뜻이 있다고도 하고 미학적 의미가 있다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가문과 종족의 표시라고도 하며 계급을 표시하거나 결혼과 출산 때 호적 대신으로 했다고도 한다.
미개사회에 있었던 문신이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보인다. 예전처럼 주술적이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장식적으로 행해진다. 홍콩에서는 한동안 관광객을 상대로 문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네스북에는 가장 문신을 많이 한 기록이나 문신미인대회 따위의 기록들이 실려 있다. 범인검거 TV뉴스에는 조폭사회의 상징처럼 잔등 가득히 호랑이나 용의 그림을 문신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북한에도 문신이 있었던지 1980년대 남파된 간첩의 팔뚝에서도 더러 문신이 있다고 했었다.
“남들과 다른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 문신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호기심에 문신을 했던 한 여고생의 고민이라고 한다. 이런 청소년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상담센터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이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9-09-02 18:3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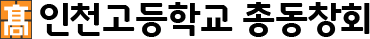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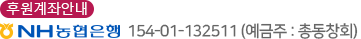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