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일(강제합병일인 8월 29일)로 예정됐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연기됐다. 수록자들의 가처분신청이 쏟아진 때문이라 한다. 친일인사 정리는 시효가 지났고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친일을 하고 애국도 한 사람들이 문제다.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그들인데 판정의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인 듯싶다.
일단의 무관들을 예로 들어 본다. 1907년 여름 대한제국 무관학교가 폐교되고 43명의 생도들은 일본육사 예비학교인 육군중앙유년학교로 편입됐다. 3년 뒤 강제합병이 되자 그들은 도쿄의 아오야마(靑山) 묘지에 모여 통곡하며 전원 자퇴, 전원 항전, 계속 재학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들의 리더는 몇 해 앞서 황실특파유학생으로 가서 육사에 진학한 김광서 생도였다. 내린 결론은 계속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하여 군대 경험을 쌓은 뒤 때가 되면 독립전쟁에 나서자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김광서·이응준·지석규·홍사익 생도는 요코하마(橫濱)로 가서 맹세했다. 조국이 부르는 날 함께 탈출해 투쟁에 나서자고. 그후 그들은 대부분 육사로 진학해 34명이 임관했다.
10년뒤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독립군 부대가 조직돼 장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탈출한 사람은 김광서·지석규·조철호뿐이었다. 김광서와 지석규는 함께 서간도로 탈출해 각각 김경천·이청천이라는 가명을 쓰며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맡아 청년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일본군과 혁혁하게 싸워 백마 탄 김일성장군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광복군 사령관이 되었다. 제자들은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고 독립군과 광복군의 간부가 되었다.
일본군에 남았던 나머지 장교들은 광복 후 미군정의 편의주의적 정책에 따라 국군 창설의 주역이 됐고 한국전쟁에서 고급지휘관으로 싸웠다. 대개가 덕장으로, 용장으로, 청렴한 장군으로 중망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아오야마의 맹세 80년이 지난 오늘 임관장교 34명 중 30명이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에 들었다. 대표적 인물이 이응준·김석원 장군이다. 이응준은 공부하려고 상경한 가출소년이었는데 준수하고 총명하여 애국지사였던 노백린 장군과 이갑 장군의 총애를 받았다. 독립협회, 신민회의 멤버로서 도산 안창호와 가까웠던 애국지사 이갑 장군은 입주과외를 붙여 보성중학에 입학시키고 무관학교로 편입시켰다. 망명길에 오르며 독립운동에 투신하라는 유지를 남겼고 자신의 무남독녀와 결혼하라는 당부를 했다. 그러나 이응준은 김광서와 지석규의 탈출에 합류하지 못했다.
그는 일본군에서 탁월한 지휘관이었다. 학병지원을 권하는 강연도 했지만 조국 독립에 고심한 흔적도 있다. 이갑 장군의 따님인 부인과 함께 도산 선생의 옥바라지도 했다. 육군대좌로 광복을 맞았고 미군정의 요청으로 국군 창설의 초석을 놓았다. 일본육사 출신이 창설 국군의 핵심을 차지한 건 그의 손에 의해서였다. 그는 총참모장에 올랐고 장병들의 존경을 받았다.
김석원 장군도 그렇다. 일본군 고급장교로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고 불우한 소년들을 위해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용감하고 청렴하여 부하장병들의 존경을 받았다.
맹세를 실천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낸 김광서·지석규 장군을 생각하면 두 장군은 용서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전에 오르게 됐고 수록명단 4천여명 중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민족애가 강했다는 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섯 해 전 민족정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출간을 결정할 때 반대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결정했고 수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둬야 할 일이었으니 책은 내야 한다. 존경하는 원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매한 사람들이 많다면 친일한 행적을 그대로 쓰고, 애국도 했다면 그것도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대에 살아보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기는 어렵다. 광복 63년 만에 출간하는 친일인명사전, 좋은 균형을 잡아 매듭을 짓기 바란다.
/소설가 이원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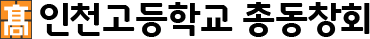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