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제헌절과 개헌(改憲)(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25. 7.16)
제헌절과 개헌(改憲)
/원현린 주필

원현린 주필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상위법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조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을 말한다. 내일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해 정한 제헌절이다. 으레 그래 왔듯이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귀중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찬란한 미래로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낼 것이다.
법의 생명은 준수에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거나 명목상 법에 지나지 않는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곧 무정부사회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독재를 불러오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正義) 실현에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는 “법이란 법 가치, 즉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실재(實在)로, 법의 이념에는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가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법이 그때그때 정치 시류에 따라 빈번히 개폐된다면 곤란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기도 했던 과거 유신헌법이다. 당시 유신헌법을 설계한 한 헌법학자는 “미래에의 결의를 표상한 헌법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헌법학의 과제는 황혼을 기다려서 비상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니라 찬란한 미래에의 의지를 가진 ‘금발의 야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권력분립은 권력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통치 원리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독재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입법부는 통법(通法)부가 되고, 사법부는 정치의 시녀가 돼 사법(死法)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는 내용의 헌법을 전문을 포함해 개정하려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4일, 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의 핵심 가치, 권력 구조 개편 방안 등 세부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이 시도된 지는 오래다. 당리당략에 흐르거나 특정인의 이해득실에 따른 개헌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굽어보고 있다. 87체제 헌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시대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 시기의 현실을 대상으로 했던 헌법을 비롯한 제 규범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의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했다. 국민들도 의식을 함께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필자도 개헌을 주장한 지 오래됐다. 개헌을 하되 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기에 하는 당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날인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출발을 상징하는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희망하며 소회를 약술해 봤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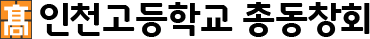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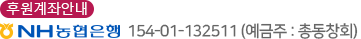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