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김병종(71회)이 읽고 그린 '노인과 바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조선일보(12.12.10)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병종이 읽고 그린 '노인과 바다'
[101 파워 클래식] 서른다섯 번째 작품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서른 때 알았다, 늙은 어부가 싸운 건 상어가 아닌 그의 운명
/김병종 화가·서울대 교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으로 어이없을 만큼 너무나 단순한 문장
단숨에 빠져들게하는 마력의 소설
혈투 끝 달콤한 휴식에 빠진 그처럼 인생의 말년쯤에 다시금 읽고파…
김병종 화가·서울대 교수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었다. 작품은 어두운 밤의 폭죽처럼 떠올랐고 작가는 천공의 별이 되었다. 그렇게 신화와 전설이 되어 사라져간 헤밍웨이지만 쿠바에 가면 현존이 된다. 불멸의 현존이기는 작품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의 집필실 핑카비히야는 울창한 숲 속에 옛 모습 그대로이고,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목선 필라호도 어제인 듯 그대로 매여 있으며, 무엇보다 작품의 배경이 된 어촌 코히마르에 가면 소설 속의 마놀린 같은 소년들이 석양을 받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이다.
몇년 전 내가 그의 서재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이 생생했다. 숫제 땀을 뻘뻘 흘리며 웃통을 벗어젖힌 채 타자기를 두드리던 그 세기의 마초가 문을 벌컥 열며 '누구냐?' 하며 튀어나올 듯이. 시내의 분위기라고 다르지 않아서 그가 살던 당시의 소련제 고물 자동차가 예사로이 굴러다니고 여인네들의 패션 또한 흑백사진 속의 육십 년대풍 그대로였다. 거기다가 그가 머물던 암보스문도스 호텔이나 수시로 드나들던 프로리디이타 같은 카페는 실내의 소품들이며 공기마저도 금방 끌려나온 부장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예컨대 그가 쿠바를 떠난 1961년부터 미국과 단교되고 대외 무역로가 봉쇄되면서, 본의 아니게 쿠바는 60년대 이후의 세월을 진공으로 남겨두게 된다. 어찌 보면 오랜 세월을 정신적 쿠바인으로 살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대문호에 대한 경의로 쿠바인들이 그의 시대를 저당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쿠바는 카스트로나 체 게바라 아닌 헤밍웨이의 제국인 셈인데, 욕먹을 소리일지 몰라도 '노인과 바다'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라면 그런 아바나행 비행기에 한 번쯤 몸을 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노인과 바다'는 쿠바적인, 너무도 쿠바적인 작품이다.
방파제 말레콘에 앉아 카리브의 햇살에 피부를 드러내며 먼바다를 바라보거나, 파도가 벽에 철썩이는 선술집에서 억센 사내들과 육감적인 물라토(혼혈) 여인들 틈에 섞여 불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노인과 바다'는 소설이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예컨대 쿠바의 바깥에서 보면 뛰어난 소설이지만 쿠바의 안으로 들어가 생전의 그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노인과 바다'는 마치 현실 위에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보탠 정도의 논픽션이나 해양 에세이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쿠바의 바깥에서 보면 이 책은 자연과 인간의 대결 국면으로 비치지만, 쿠바의 안으로 들어가 여인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짐승의 숨소리처럼 거친 바닷바람과 마주하고 있다 보면, 인간과 자연은 결코 적대적이거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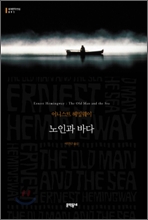
어찌 됐거나 참혹할 정도의 문학적 혹평과 몇 차례의 이혼 등 극한적 절망과 어둠을 헤맨 끝에 작가가 내놓은 이 단순하고 짧은 소설은 경이롭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의 하나가 되었을뿐더러 퓰리처상과 노벨상을 연달아 몰아오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성공에 가장 놀란 것은 작가 자신이 아니었을까 싶다. 기자 출신답게 왜, 언제, 누가 식으로 단도처럼 치고 들어오는 하드보일드한 문체와 일직선의 작품 구조는 누구라도 쉽게 빠져들게 하지만 막상 이 작품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노인과 바다'가 단순한 해양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썰미 있는 독자라면 금방 눈치 채게 되는 것인데, 작가는 믿을 수 없이 단조로운 구도 위에 엄청나게 복잡한 인생의 상징을 실어놓고 있는 것이다.
삶의 환호와 슬픔, 득의와 상실, 영광과 상처, 후회와 갈망, 그리고 사랑과 젊음의 덧없음에 대해 이처럼 절절하게 토해낸 작품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청새치도, 상어도, 심지어 바다까지도 그 극적이면서도 오묘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소도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작품은 이처럼 어떤 대하소설로도 이길 수 없는 힘과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색 스펙트럼처럼 읽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색채와 빛깔로 읽힌다는 점 또한 최대 미덕일 것이다.
나만 해도 고교생 때 영어 공부 삼아 원문으로 읽었을 때에는 그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구도와 문장 때문에 그가 받았다는 노벨상마저도 우스워 보였지만, 서른 즈음에 다시 읽었을 때는 노인이 피투성이로 싸운 것이 상어가 아닌 존재의 허무와 운명 같은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투 끝에 얻은 그 거대한 노획물을 빼앗기고 돌아와 달고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의 그 평안과 고요를 맛보기 위해 언젠가 다시 이 책을 읽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나 역시 산티아고 노인처럼 등으로 석양을 받으며 인생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을 것 같다.
입력 : 2012.12.10 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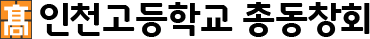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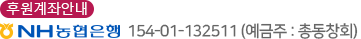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