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한인(韓人) 러시아 이주통사(移住痛史) 유감(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25. 2.26)
한인(韓人) 러시아 이주통사(移住痛史) 유감
/원현린 주필(主筆)

원현린 주필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려 지난 주말에 다녀왔다.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이주사(移住史)를 약술해 본다.
고려인(高麗人)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4년 무렵 시작됐다. 당시 흉년과 대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넌 조선인은 1910년대 초 6만여 명에 이르렀다. 대부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 조·러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인촌을 건설해 생활했다. 조선인들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5년부터 민족운동을 시작, 의병 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917년 조선인은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격랑을 만났다. 혁명에 참가했던 조선인들은 고려인 민족자치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937년 고려인들에 대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이뤄져 17만여 명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보내졌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갈밭과 진펄’만 있는 황량한 곳이었다.
소비에트 정부의 배신으로 조선인은 마음 편히 거처할 곳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첫해 겨울을 넘기는 동안 이주민의 22%에 달하는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 노인과 어린아이였다. 지우고 싶은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지위는 ‘행정적 추방인’이었다. 특별이주자 취급을 받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공민권도 제한됐다. 이러한 지위는 스탈린이 죽고 그에 대한 비판이 공식화되는 1957년까지 이어졌다. 고려인이 기댈 곳은 당시 소련의 집단농장 정책에 적극 참여, ‘콜호스 건설’에 참가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이 소련을 곧 조국으로 여기는 마음을 내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특별이주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1956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소련 최고회의가 ‘특별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거주에 대한 제한 조치 해결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 실로 오랜만에 스탈린 시대 강제 이주된 민족들의 명예 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결사체가 없었던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이나 과거에 살았던 연해주로 돌아가는 공식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고려인들은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가기 시작했다. 안전하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에 생활 본거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굳건하던 소련 체제는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해 억압적 민족정책을 완화해 갔다. 고려말로 쓴 문학 작품도 등장했다. 김기철의 소설집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1987), 통합 시집 「꽃피는 땅」(1988) 등이 대표작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신분과 처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립국가가 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자신들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되찾아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고려인 사회에서 학문, 예술 분야의 지식인층은 사라지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고려인 비중도 감소했다.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심화돼 가고 있다. 그들은 현지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상기 내용은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획전시된 고려인 이주 160주년 약사(略史)를 전재해 본 것이다. 고려인 러시아 이주사를 되짚어 보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 참상에 마음 먹먹할 뿐이다. 2024년 6월 말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은 총 8만1천150명에 이른다. 이 중 함박마을을 비롯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1만501명에 달한다. 오랜 세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말과 글, 전통을 지켜온 고려인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을 잊지 못해 뿌리를 찾아 고국을 찾은 이들의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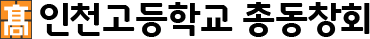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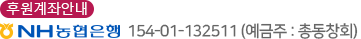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