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자연(自然)으로 돌아가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25. 4. 9)
자연(自然)으로 돌아가다
/원현린 주필(主筆)

원현린 주필
지난주엔 농가에서 본격 봄농사 준비에 나선다는 절기상 청명(淸明)과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풍습이 있는 한식(寒食)이 있었다.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 산불 위험에 비상이 걸리곤 한다. 조상들도 자손들이 묘를 찾아 불씨 관리를 잘못해 자칫 산불을 내는 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에서 경험했듯이 성묘는 산자수려한 국토를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좁은 국토를 지닌 우리다. 조상들도 가뜩이나 부족한 후손들의 양택지(陽宅地)를 유택(幽宅)으로 나눠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산지에 장사 지내는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지는 요즘이다. 매장에서 자연장으로 변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매장문화였으나 근자 들어 화장 후 납골이 대세였다. 이제는 납골을 대신해 화장 후 골분을 나무나 숲속, 바다에 뿌리는 수목장과 바다장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산림과 바다가 새로운 산골처(散骨處)로 떠오르는 것이다.
장지로서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 정한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몇 해 전 필자의 지인 중 한 기업인이 인천 앞바다에 산골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달리했다.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유족들은 유지를 받들어 서해상에 골분을 뿌렸다. 그동안 애매한 영역으로 남아 있던 이 같은 해양 산골장(散骨葬)이 합법화된 것이다.
바다장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진다. 대왕은 나라를 21년 동안 다스리다가 영륭(永隆·당 고종의 11번째 연호 680∼681)2년 신사년(681년)에 죽었는데,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내라고 유조를 내렸다. 왕은 평소 늘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말했다. "짐은 죽은 뒤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높이 받들면서 나라를 지키고 싶소." 여기서 문무왕(文武王)이 남긴 ‘용이 되겠다’는 유언이 있어 그의 수중릉이 감포 바닷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능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지 경주의 능지탑이 왕을 화장한 곳이라고 사가(史家)들은 추정한다.
자연장이라 할 수 있는 우언(寓言)도 있다. 2천300년 전 중국 장자(莊子)의 제자들은 스승이 죽으면 후하게 장사 지내려 했다.
그러자 장자는 "나는 하늘과 땅으로써 속관과 덧관을 삼고, 해와 달로써 한 쌍의 구슬을 삼으며, 별들로써 장식의 옥을 삼고, 만물로써 제물로 삼고 있으니 나의 장례 도구 중에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을 더 보태려 하느냐"라며 장례 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라는 유언인 셈이다.
장자의 또 다른 일화가 있다. 장자는 부인이 죽자 슬퍼하며 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불렀다. 친구 혜자(惠子)가 문상을 하며,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장자는 "그녀는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지금 또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사시(四時)가 가는 것처럼 변하여 이처럼 죽었네. 아내가 하늘과 땅, 큰 방에서 잠들려 하는데 내가 시끄럽게 곡을 한다는 것은 천명(天命)에 불통(不通)한 일이라 생각되네"라고 답변한다. 인생이란 그저 자연에서 시작된 삶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것이다.
삶과 죽음 등 인생을 논할 때 회자(膾炙)되는 시구가 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죽음은 또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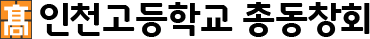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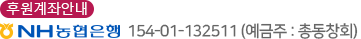










댓글목록 0